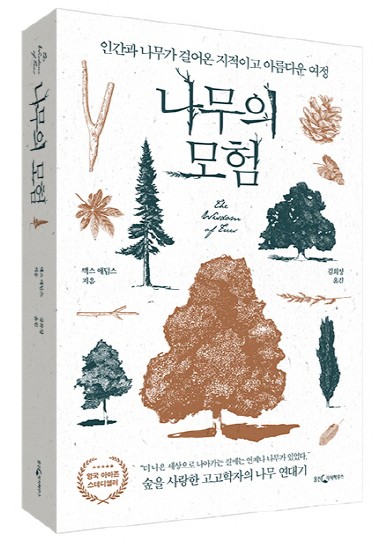
맥스 애덤스/ 인문학

팽성도서관
나무를 좋아하게 된 건 스무 살, 처음 부모님의 품을 벗어나 대학교 기숙사에서 생활을 시작할 때다. ‘눈뜨고도 코 베인다’는 서울은 너무나도 불안한 도시였다. 마음이 불안하거나 부모님이 그리울 때면 늘 기숙사 뒤편 나무들이 무성한 곳 아래에 자리를 잡고 누웠다. 나무가 무성한 기숙사 뒤편은 서울에 홀로 올라온 나를 위해 세상이 선물한 공간 같았다. 그곳은 봄에는 흰 눈을 소복하게 얹은 듯했고 여름에는 초록빛깔 이불을 덮은 듯했으며 가을엔 노란 물감을 칠한 수채화 그림 같았다. 여기에서 나무들의 1년을 모두 지켜본 후에야 그 나무들의 이름이 이팝나무라는 것을 알았다. 이팝나무를 알게 된 스무 살, 그때부터 나무를 좋아하게 되었다.
희망도서를 구입하는 업무를 하던 중 <나무의 모험>이라는 책을 알게 되었다. 제목도 매력적이지만 “더 나은 세상으로 나아가는 길에는 언제나 나무가 있었다”라는 책표지 문구가 참 마음에 들어 읽기 시작했다.
작가는 나무가 우리를 세 번 따뜻하게 해준다고 말했다. 나무를 벨 때, 나무를 쌓아 올릴 때, 그리고 나무를 태울 때이다. 이 얼마나 아름답고 감사한 존재인가. 책을 읽는 내내 어린 시절 수십 번은 더 읽어본 책 <아낌없이 주는 나무>를 떠올렸다. 소년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고도 아쉬워 밑동을 내어주며 쉴 수 있게 해준 아낌없이 주는 나무, 하지만 페이지를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현실의 나무는 소설 속 아낌없이 주는 나무보다 더 희생적이며 아름다운 존재라는 것을 온몸으로 느꼈다.
『사과나무 목재는 불에 태우면 매우 달콤한 향기가 난다. 또 나뭇결이 아름다워 베니어판과 가구를 만들 수 있고 … (중략) … 사과 꽃이 활짝 피면 벌, 딱정벌레, 말벌, 파리 등의 곤충들이 데로 모여들어 성황을 이루고 과수원, 산울타리, 뒷마당, 가로수길 등을 환하게 밝힌다. 늦여름이 되면 발그레한 초록색 열매들이 가지가 휠 정도로 매달리는데, 그 풍성한 과즙과 달콤함은 비옥한 자연의 상징이라고 해도 부족함이 없다.』 107p. 발췌
나무는 무한한 친절과 관대함을 가진 너무나도 특이한 유기체이다. 대가를 바라지 않고 한평생 만들어낸 것들을 내어 준다. 심지어 도끼를 들고 공격하는 사람들마저도 그늘로 보답을 한다. 그렇다면 이 나무들을 앞으로 어떻게 대해야 할까?
작가는 “나무를 베지 말자” 라던가 “종이를 아끼자”라고 외치지 않는다. 나무를 진정으로 보호하는 방법은 종이를 더 많이 소비하고 성냥을 사고 참나무와 단풍나무로 만든 가구도 들이고 유리가 이중으로 들어간 나무 창호를 다는 것이라 한다. 숲은 유용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종이 없는 사무실을 외치는 것 보다 책을 한 권 더 사는 것이 숲을 구하는 것이라 한다. 그러니 이 글을 읽고 있는 여러분들도 나무의 모험이 조금 더 길고 풍성해 질 수 있도록 책 한 권 씩 구매하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