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27] 신시가지_08 | ||
학교 가는 길 3
 | ||
| ▲ 지장초등학교 가을운동회(1993년) | ||
 | ||
| ▲ 이수연 한국사진작가협회 전 부이사장 | ||
■ 물 귀한 쑥고개, 아내의 냇물 밟기
1985년 어느 날 세 살배기 딸을 유모차에 태우고 아내와 함께 지산천 쪽으로 나들이 나섰다. 물이 귀한 쑥고개다. 비록 발목밖에 차지 않는 시냇물이지만 내가 딸을 보는 동안 아내는 물속을 걸으며 잠깐 즐겼다. 벌써 40여 년 전의 일이다.
송북초등학교 바로 앞으로 흐르는 지산천을 나는 학교 앞 냇가라고 불렀다. 그 지산천은 동막 저수지에서 흘러나와 나무내라 부르는 목천을 지나 구장터로 해서 진위천과 합류한다.
동막은 학교 뒷동네 부락산 기슭의 마을 이름이고 동막저수지는 거기서 따온 명칭이다. 학교 후문을 지나 더 깊숙하게 산 쪽으로 들어가야 나온다.
지산천 물길을 따라 아파트단지가 들어섰고, 항공기 소음으로 폐동廢洞한 구장터 이주민들이 새롭게 터전을 일군 이주단지도 생겼다. 시내의 번화가에는 미치지 못하나 주차장 넓게 마련한 레스토랑이나 크고 작은 카페들이 연신 들어서면서 대로변에는 상가를 형성했다.
동막 가는 길에서 슬쩍 옆길로 들어서면 일찍 들어선 전원주택들이 세월과 보폭을 맞춰 어우러진 모습으로 산책객을 맞이하고 다른 한쪽에는 산림체험장과 꽤 근사한 공원도 산기슭 아래에 자리 잡았다.
이리 동네 사정에 빠삭한 듯 말을 하지만 학교 다닐 때는 동막이 어딘지 몰랐다. 동막이라는 이름과 세트처럼 따라다니던 이름이 건지미로 불리는 건지마을과 우곡이다. 동쪽의 막다른 마을이라서 동막이고 떼(芝 지초, 떼)가 마를 정도로 건조한 곳이라서 건지미이며, 소가 누워있는 형국이라 해서 우곡牛谷, 소골이라고 했단다.
동막 아래쪽으로는 한양에서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등 남쪽의 세 지방으로 내려가는 삼남길이 있었고, 조선조 명재상이던 맹사성의 설화가 동막골과 소골 일대에 전해지지만, 초중고교 12년 동안 어느 선생님도 그런 걸 알려주지 않으셨다. 설사 알려주셨다 한들 크게 달라질 게 있었으랴만 학교 다니던 시절에는 그곳에 특별하게 가깝던 동무도 살지 않았기에 동막이나 소골 은 그저 인근 마을 이름일 뿐이었다.
그래도 초등학생 시절, 학교 앞 시내를 중심으로 아래위에 있었던 건지미는 알았다. 학교 옆 동네여서라기보다는 내게 남은 이발소 기억 때문이다.
건지미에는 시내와 비교해서 비교적 허름?한 이발소가 있었다. 당연히 이발비도 저렴했다. 동네 목욕탕에 붙은 이발소에서 깎으면 좋을 텐데 어머니는 그 이발소 요금을 주지 않으셨다. 아침 시장 안에 이발소가 있었어도 요금 물어보고 다시 돌아 나올 숫기가 없었기에 요금이 확실한 학교 옆 이발소까지 먼 길을 가야 했다. 그걸 아신 어머니가 곧 이발 요금을 시가?로 인상해주셔서 그런 일이 많지 않았지만 아주 독특했던 건지미의 기억 중 하나다.
졸업 이후 도시가 급격하게 팽창하면서 집들이 드문드문하던 학교 앞 동네까지 행정 명칭을 붙였는데 기록으로 남긴 내 사진 속 풍경을 다시 볼 때까지 그 동네 이름을 알 수 없어서 이리저리 확인해야 했다. 아래 건지미며 송천동이며 지산동이 어디서 어디까지고 등등이 그랬다.
■ 못내 아쉬운 지산천의 아름다움
파일 철에서 쑥고개 사진을 뒤지면서 가장 아쉽게 다가오는 게 ‘파라다이스 뽀드장’을 메워버린 것만큼 학교 앞 시내인 지산천을 덮어버린 것이다. 그 물로 농사를 지었는지 확실한 기억은 없다. 세상이 바뀌어 논도 밭도 다 사라졌으니 굳이 농업용수로 남아 있을 필요는 없을 테다. 그렇다고 아쉬움의 이유가 냇가 옆 논에서 쟁기질로 엎어놓은 흙덩어리 속 올망대기를 찾아 먹어보라던 동무의 얼굴 때문은 아니다. 하굣길 내 눈에 띄어 잡힌 천변川邊 논바닥 참게의 추억 때문도 아니다. 시내의 물막이 아래에서 땀 찬 러닝셔츠를 빨겠다며 넓적한 돌로 빨랫방망이 흉내 내다 온통 넝마로 만든 기억 때문도, 그래도 꾸지람 듣지 않아 참 다행스러웠던 기억 때문도 아니다. 그렇다면 무언가? 개천을 살려두었더라면 아파트가 들어서지 않았거나 저만치 물러나 지었을지 모른다는 치기 어린 생각은 더더욱 아니다. 내 동네 한복판으로 가느다랗지만 생명줄처럼 한 가닥 물이 흘렀더라면 하는 아쉬움 같은 것? 그것도 아닌 것 같다. 모르겠다. 그냥 아쉽다.
풍경 사진을 그다지 선호하지 않지만 낡은 흑백 사진으로 남은 학교 앞 눈 덮인 지산천은 각별하다. 모든 낯익음을 낯섦으로 바꾸고 디테일 대신 형태만 덩그러니 남긴 풍경 때문이다. 하나 더 보탠다면 옛 추억의 감칠맛이겠다.
그 아름다웠던 모습을 뒤로한 채 이미 도로가 된 지 오래인 물줄기를 따라 내려가 본다.
학교 앞에서 오른쪽으로 슬쩍 방향을 틀면서 어느 아파트의 이면도로가 된다. 거기서 내쳐 내려가면 분양 당시 송탄에서 가장 큰 평형을 보유했다던 어느 아파트 앞에서 4차로로 바뀌고 송탄에서 가장 교인이 많다는 어떤 교회 부근에서 비로소 쑥고개 첫째 다리와 만난다.
첫째 다리는 앞서 말한 대로 쑥고개 사람들이 서울 방향으로 가다가 처음 만나는 다리를 말한다. 예나 지금이나 다리랄 것도 없다. 그런 다리에 이름 붙여 부르던 것은 달리 그곳이 어디라는 걸 알릴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나마 지금은 이곳이 다리였다는 것을 알 방법도 없다.
지산천은 오거리로 바뀐 그곳에서 다시 비스듬하게 몸을 틀어, 좁은 틈새에 억지로 끼워 넣은 듯한 고가도로 아래를 지난다. 그다음은 목천동, 구장터다. 그곳이라고 세월이 비켜 갈 리 없다. 온종일 경부철도에 수도권 전철과 무시로 덮쳐오는 군용기 소음을 무릅쓰고 도시화 되었다. 그 속을 비집고 내려가 결국 5km 남짓한 지산천 종점인 진위천과 만난다.
내 학교 가는 길도 그렇게 끝난다.
참, 지산천 길이가 궁금해서 자료를 찾다 보니 <송탄시사>에 수록된 지산천만 네 곳이다. 좌동천, 동막천, 오좌천, 우곡천 모두 지산천에 속한다. 갑자기 골치 아파졌다. 그냥 내 마음속 학교 앞 시내로 남겨야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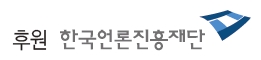
※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